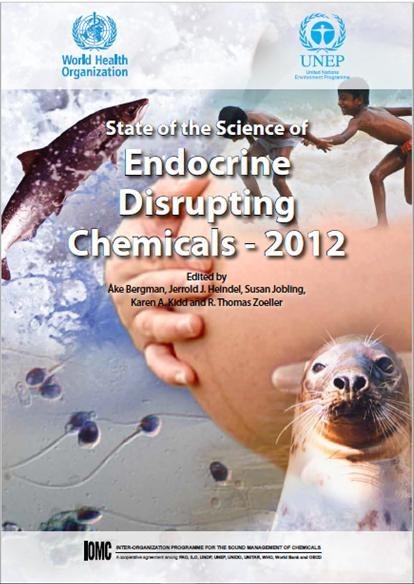제목을 써놓고 보니 교집합이 생각났다.
우리는 모두 교집합의 세상에서 살아간다.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면서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며
누군가에게 내가 만든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만든 음식을 먹기도 한다.
어느 것 하나 동떨어져 단 하나의 완벽한 독립체로 살아갈 수 없는 운명, 그것이 인간의 삶이고 굴레가 아니던가.
그런 면에서 우리 동네 빵집 '망캄'을 갈 때마다 불쾌감을 떨칠 수 없다.
나는 음식 솜씨가 뛰어나지 않지만, 정성을 다해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만든다.
명절에, 손님이 집을 방문할 때, 외부에서 차 한잔을 대접할 때도 의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나와 내 가족이 먹듯 음식을 준비하게 된다. 단지 이것은 나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동네 빵집 '망캄'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유기농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유일한 곳이다.
바로 집 앞에 국내에서 가장 크고 그 일가가 빵집 경영권을 틀어쥐고 있는 프렌차이즈빵집이 있지만 정말 귀찮아서 길을 건너기 싫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빵이 먹고 싶을 때는 '망캄'을 이용한다.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해서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슈크림빵의 슈크림이 딱 좋을만큼 충부히 꽉 차 있는 것도 좋고, 가볍지 않고 그렇다고도 집에서 빵을 만들 때처럼 묵직하지도 않게 딱 전문가가 만든 빵다운 빵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다.
어제도 그러했다.
빵집을 들어설 때는 내가 먹을 빵만을 생각했고
빵들을 보면서도 그 맛을 상상하고 냄새를 맡으며 그 빵을 먹고 있을 나를 생각하며 즐거웠다.
한데 빵을 고르고 값을 치르는 순간 계산대 바로 옆에 서 있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행동을 대하면서 계산하던 빵을 집어 던지고 그대로 그 집을 나오고 싶었다.
"나는 이런 빵집 따위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천박하게 계산대에서 돈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골똘히 고민하는 듯
하릴없이 도마를 들었다 놨다 하며 계산대에 줄지어 선 채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을 심드렁한 듯 곁눈질로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그 시선을.
그리고 시선에서 묻어나는 감정을. 어렴풋하게나마.
순전히 지나친 나의 오해일 수도 있으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은 매번 '망캄'을 방문하여 그를 마주칠 때마다
나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낀바 있다는게 문제다.
그는 그런 마음으로 빵을 사람들에게 팔면 안되는 사람이라는게 내 결론이다.
집에 돌아와 빵봉지를 쳐다보자니 잠시 내동댕이치지 않고 그냥 들고 온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나
이내 궁금증이 일었다.
왜 그는 그랬을까... 그는 왜 그럴까...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
몇 년 동안 내내 ...?
빵을 만든다는 남편과 관계가 안좋은가?
매번 갈 때마다 테이블은 물론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 동네 어딘가에 큰 빵집을 또 냈다는 소문이 있으니 재정 상황이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으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골몰한 나머지 표정 및 감정관리가 안되는 것은 아닐 터...
국내산 토종 앉은뱅이밀을 10kg 이나 잔뜩 사놓고 가스오븐렌지가 고장나는 바람에 전기오븐렌지로 빵을 구우니 영 제맛이 안나 하는 수 없이 여기 '망캄'에 올 수 밖에 없었노라며 내 자신을 다독이며 오늘 빵반죽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이다.
'망캄'의 주인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
우리 집 바로 앞의 상가의 떡집.
그 집 주인도 매번 같은 얼굴로 사람들을 맞는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떡집' 따위를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빵집이 뭐 어때서?
떡집이 뭐 어때서?
빵 만드는 걸 배우고
떡 만드는 걸 배운 나로서는
누군가에게 팔 정도로 빵과 떡을 만드는 게 '꿈'이다. 이 사람들아.